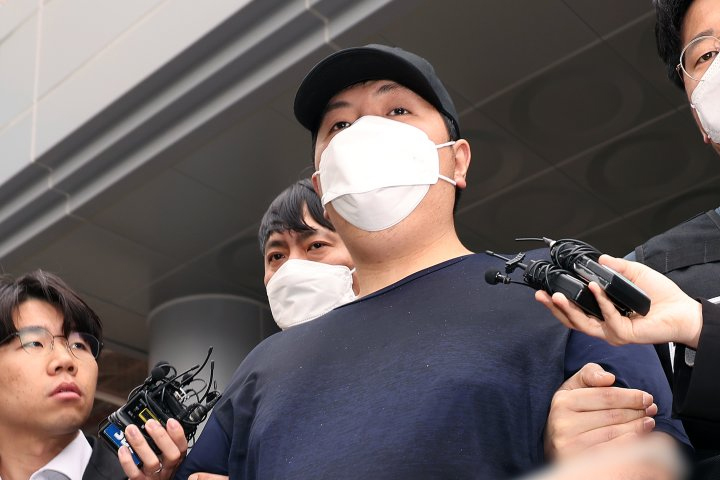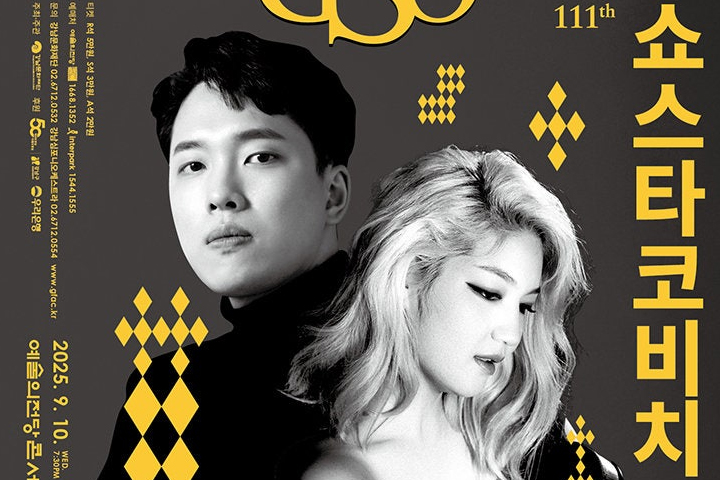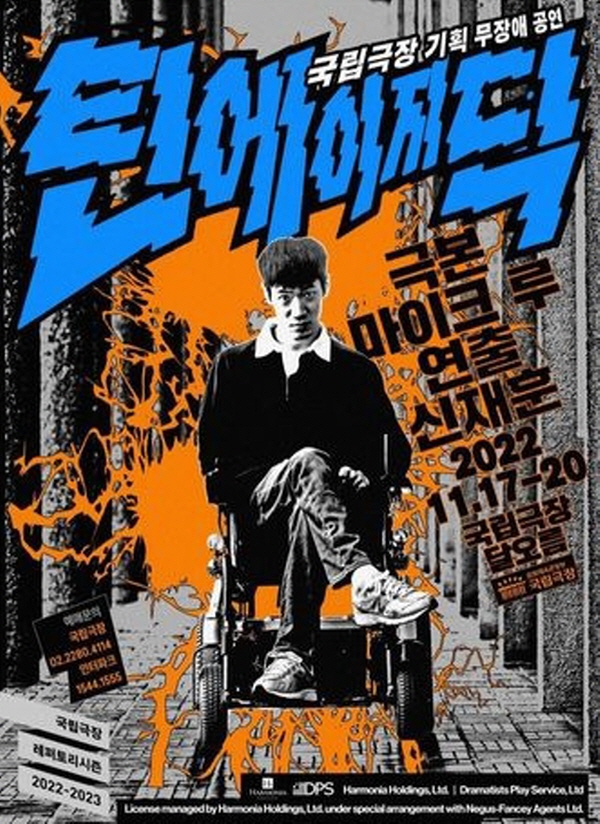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원재료, 물류비, 인건비 등 전방위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 관리 기능이 약화된 틈을 타, 그간 억눌렀던 가격 인상 욕구를 분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원재료, 물류비, 인건비 등 전방위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 관리 기능이 약화된 틈을 타, 그간 억눌렀던 가격 인상 욕구를 분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최근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한 업체가 가격 인상의 물꼬를 트면, 경쟁사들도 기다렸다는 듯 뒤따르는 '도미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먼저 농심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 17일 라면과 스낵 등 17종 가격을 평균 7.2% 인상했다. 곧바로 오뚜기도 다음 달 1일부터 16개 라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역시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8.9% 올리며, 오리온은 지난해 초 가격 동결을 약속했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을 버티지 못하고 11월에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팔도도 라면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아직 가격을 동결한 다른 업체들도 추가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현 정국 상황을 식품업계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한다. 물가 안정은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있어도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물가 컨트롤타워의 감시 기능이 약해진 틈을 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5개월간 식품 가격 인상 건수가 20건을 돌파하며 먹거리 물가가 요동쳤다.
기업들은 한결같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환율,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물류비,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분통을 터뜨린다. 비용 상승 요인이 사라져도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비용 상승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원자재 수입 경로 다변화 등 자체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가격 인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도 국민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주체"라며, "정부의 감시 기능이 약화된 틈을 노려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체크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